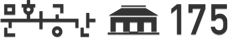결국은 존재에 관한 외침
서울시무용단 <더 토핑>
글. 장혜선(객원기자) 사진. 윤문성(세종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
최근 여러 무용단에서 다양한 안무가 육성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다.
서울시무용단의 <더 토핑>은 장르간 협업에 방점을 찍지만, 결국은 인간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국내 무용단의 안무가 육성 프로젝트
최근 안무가 육성 프로젝트가 활발하다. 여러 국내 무용단이 소속 무용수의 잠재된 능력을 발굴해 차세대 안무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립발레단은 2015년부터 ‘KNB 무브먼트 시리즈(KNB Movement Series)’를 시작했다. 단원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새로운 작품을 발굴하고, 발레 안무가로 성장할 기회를 마련한다. 특히 우수 작품은 해외 공연 기회가 주어진다. 국립발레단 솔리스트 강효형은 2015년 ‘KNB 무브먼트 시리즈’에서 안무작 <요동치다>를 올려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이듬해 슈투트가르트 발레 기획 공연인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작품을 선보였다. 2017년에는 강효형의 신작 <허난설헌-수월경화>가 국립발레단 시즌 레퍼토리에 포함됐다.
국립무용단도 단원의 안무작을 레퍼토리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 3월, 국립무용단은 젊은 창작 프로젝트 ‘넥스트 스텝(Next Step)’을 시작했다. ‘넥스트 스텝’은 단순한 일회성 발표를 넘어서 작품을 발전시켜 레퍼토리화하는 가능성을 열어 둔다. 올해 ‘넥스트 스텝’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로 주목받은 이재화의 <가무악칠채>는 2018~2019 시즌 국립무용단 정규 레퍼토리로 선정됐다. 국립무용단은 내년 4월에 두 번째 ‘넥스트 스텝’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립현대무용단 픽업스테이지 ‘스텝업’은 공모를 통해 가능성 있는 기존 창작물을 선정, 안정된 제작 시스템을 지원해 완성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좋은 현대무용 작품을 발굴해 지속해서 유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국립 단체가 차세대 안무가 발굴을 위해 힘쓰고 있다. 서울시무용단 역시 단원 창작 프로젝트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2015년부터 꾸준히 선보이고 있는 서울시무용단의 <더 토핑(The Topping)>도 단원들이 직접 안무에 참여하는 프로젝트다. 서울시무용단의 독특한 차별점은 ‘협업’에 방점을 찍는 것이다. ‘더 토핑’이라는 공연명에서 느껴지듯이 한국무용과 다양한 장르를 결합한다. 2015년에는 한국무용과 스트리트 댄스, 발레, 애니메이션, 연극, 국악과의 컬래버레이션을 시도했다. 당시 장르의 벽을 깬 과감한 시도로 한국무용의 잠재력을 확인했다. 2016년에는 3개의 옴니버스 형식으로 배우와 영화, 염색과 협업한 무대를 올렸다. 특히 안무가 박수정의 <지나가는 여인에게>는 2017년 스페인 빌바오 액트 페스티벌에 초청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17년에는 사물놀이, 드로잉아트, 뮤지컬, 판소리와의 협업을 통해 장르의 폭을 대폭 넓혀 실험적인 무대를 완성했다.




인간 내면의 문제에 집중하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서울시무용단 <더 토핑>이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에 올랐다. 10월에 개관한 S씨어터는 실험적인 예술작품을 위한 300석 규모의 블랙박스형 극장이다. 가변형 무대인 S씨어터에서 도전적이고 자유로운 안무작을 만나리란 기대감을 품고 공연장에 들어섰다. 무대 구조가 일반적 프로시니엄 형태로 되어있어 조금 아쉬웠지만, M씨어터보다 밀집된 공간감은 밀도 높은 공연을 기대하게 하였다.
서울시무용단 단원 유재성이 안무한 <플레이풀(PLAYFUL)>이 첫 순서로 올랐다. 이 작품은 드러머와의 협업을 꾀한다. 파란 조명이 드럼을 비추자 드러머가 리드미컬 사운드를 뽐낸다. 두툼한 패딩을 입은 무용수가 쭈그려 앉은 뒷모습으로 무대에 등장한다. 패딩에 가려진 몸과 낮은 키는 작은 사람, 즉 어린아이의 형상처럼 보인다. 아이가 자라나 어른이 되기까지 세상은 모든 것을 제한한다. 아이들의 반짝이던 상상력은 퇴색되고, 무한 경쟁의 질주에만 열을 올린다. 안무가 유재성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현대인에게 질문을 던진다. 드럼 비트가 고조되면 무용수들은 패딩을 벗고 어른의 몸으로 관객을 마주한다. 자신을 얽매던 옷을 벗어 던지고 리듬에 따라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몸은 그야말로 청춘에게 고하는 자유의 메시지이다. 춤추고 노래하듯 삶을 즐기라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다.
이어진 순서는 단원 강환규의 안무작 <레옹>이다. 이 작품은 영화 <레옹>을 소재로 한다. 박수정이 연출을, 조충호가 음악을 맡았다. 무용수들은 영화 속 주인공들과 비슷한 복장을 하고 무대에 올랐다. 레옹과 마틸다의 만남, 외부와의 충돌, 순수한 사랑의 아름다움이 순차적으로 재현됐다. 영상으로 접했을 때보다 레옹과 마틸다의 감정선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단원 김지은의 <낯선 시선>은 매끈한 플롯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소설가 여태현의 대본을 바탕으로 연극배우 정유진이 대사를 전한다. 무용수들은 배우 정유진의 내면이 되어 다양한 심리를 움직임으로 풀어낸다. 정유진은 세상에 던져진 나, 타인의 불편한 시선에 노출된 나를 발화한다. 흰옷을 입은 무용수들은 ‘나’라는 인물의 분열된 자아를 아슬아슬한 움직임으로 담는다.
단원 홍연지의 <왈츠>는 70년대 대중가요에 춤을 입혔다. 국악타악그룹 타고의 멤버인 김시원이 편곡, 전 국립발레단 발레마스터 염지훈이 연출을 맡았다. 검은 옷을 입고 얼굴에는 수염을 그린 여성 무용수가 무대에 등장해 춤을 춘다. 바람에 날아갈 것 같이 여리여리한 무용수의 얼굴에 덧칠해진 검은 수염은 잃어버린 자아를 상징한다. 흰옷을 입은 무용수는 반짝반짝 빛나던 젊은 시절이다. 둘은 마주 보고, 대화하고, 안아주며, 서로를 위로한다. 70년대 포크송은 빛나는 청춘 문화를 상징하는 은유로 느껴진다.
이진영의 <트루스(TRUTH)>는 모션 캡처와의 결합을 시도했다. 모션 캡처는 관절부에 전자 마커를 부착해 몸의 움직임을 카메라가 인식, 모니터로 관절의 움직임을 살필 수 있는 기술이다. ‘나’를 상징하는 한 명의 무용수와 나의 그림자 같은 네 명의 무용수가 무대에 선다. 간헐적으로 검은 배경에 투영되는 무용수의 움직임은 불안한 내면을 담는다.


이번 <더 토핑>은 서울시무용단 단원들의 삶에 관한 사색이 오롯이 무대 위에 구현됐다. 작품을 올린 무용수들은 대부분 실존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이처럼 젊은 시절을 지나 영글어가는 무용수들은 자연인의 삶을 의식하고 있다. 이번 공연을 통해 무용수들은 세속적인 괴로움을 안무로 풀어보고자 했다. 그러므로 올해 <더 토핑>은 실험적이기보다는 인간적으로 다가온다. 극장을 찾은 관객은 현실의 나를 의식화하는 새로운 기회가 됐으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