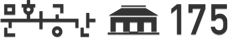지론을 갖춘 지휘
서울시국악관현악단 김철호 단장 인터뷰
writer 송현민(음악평론가) / photo 이도영(STUDIO D) / stylist 이서연
3월 23일, 취임공연을 앞둔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의 김철호 단장을 만났다.
깊은 고민으로 쌓은 ‘공력’과 다양한 체험으로 다진 음악적 ‘체력’이 느껴졌다.
김철호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단장)

김철호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단장)
“지휘자가 없는 음악이 가장 잘된 음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작만 알리고 연주자들 간의 호흡을 힘으로 삼아 흘러가는 음악 말이지요. 그래서 최소한의 지휘로 최대한의 아름다움을 갖춘 음악을 창조하는 이가 진정 ‘멋진 지휘자’라고 생각합니다.”
김철호 단장에게 지휘에 대하여 물으니 여러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러던 중 내 머리 속에는 ‘집(集)’이라는 한자가 떠올랐다. 모은다는 뜻이다.
“우리 식대로 이야기한다면 여러 소리가 하나로 꼬아지는 게 아닐까요? 아니면 여러 갈래의 털들이 모여 붓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소리의 올을 하나하나 모은 붓으로, 그는 음악을 쓴다. 그런 그의 지휘법, 아니 필법은 ‘무위자연(無爲自然)’을 연상케 한다.
“지휘자가 없는 음악이 가장 잘 된 음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작만 알리고 연주자들 간의 호흡을 힘으로 삼아 흘러가는 음악 말이지요. 그래서 최소한의 지휘로 최대한의 아름다움을 갖춘 음악을 창조하는 이가 진정 ‘멋진 지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지휘봉을 잡기 전에 대금 연주자요, 작곡가였다. 국립국악원 연주단에서 대금 연주자로 재직하던 시절 “한국음악의 소리가 지금과 같은 형태를 갖게 된 미학적인 이유와 원리를 궁금해” 했다.
“회화에 필법(筆法)이 있는 것처럼, 음악에도 소리에 관한 율법(律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이성과 감성은 이러한 그가 잡아야 할 ‘두 마리 토끼’였다. 허균, 성현 등이 지은 문집 속 한국음악에 관한 지식과 왕조실록에 담긴 궁중음악의 원리를 읽고 생각했다. 이성을 수반한 움직임과 함께 감성으로는 연주와 작곡에 임했다. 1980년대와 1999년대에 연극음악 ‘어떤 날’, 무용음악 ‘꽃신’ ‘우리’ ‘인다리’ ‘벼’ ‘비손’ ‘파도’, 국악관현악곡 ‘하늘과 구름’ ‘김산’, 음악극 ‘우리들의 사랑’ ‘구로동 연가’, 성악곡 ‘단장’ ‘벽시’ ‘새로운 길’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껍데기는 가라’ 등을 작곡했다.

“시대와 공감하는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했지요. 그러면서 이 작품들에는 저만의 내적 고민도 담겨 있었고요. 연주에서 작곡으로, 음악을 접하는 통로가 넓어질수록 고민도 다양해졌습니다. 마음 한편에선 서양음악에 대해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또 한편에선 해답도 못 찾고 있는 상황이 다른 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요.”
그런 그가 지휘봉을 처음 들었던 때는 1984년, 국립국악원의 창작음악 발표회에서다. 당시는 전국의 대학교에 국악과와 지방마다 국악관현악단이 척척 생겨나던 때였다.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은 직간접적으로 국악계에 영향을 주며 새로운 형태의 합주곡도 많이 쏟아져 나왔다. 국악원에선 ‘싹수 있는’ 지휘자가 늘 필요했고, 삼십 초반의 김철호가 눈에 띄었다. 1986년 국립무용단의 ‘도미부인’이 해외에 오를 때, 그는 직접 지휘봉을 잡기도 했다. 총아로 대우 받았지만 연주와 작곡을 할 때처럼 고민은 지휘로도 이어졌다.
“김중석 선생님(전 인천시향 초대 상임지휘자)으로부터 대학원 클래스에서 음악을 예비시키는 법, 박자를 짚는 법 등을 배우면서 ‘지휘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 명을 음악에 집중시키게 하는 힘, 깔끔한 시작과 끝으로 음악을 결실 맺는 법을 깨달아 가던 때였지요.”
지휘에 대한 고민과 경력이 쌓이면 김철호 단장은 단단해졌다. 이후 청주시립국악단(1995~1996)의 상임지휘자로 취임하여 본격적으로 지휘 인생을 시작했다. 이후 대전시립연정국악원(1996~1997), 국립국악원 정악단(1998~2003),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2010~2015), 경상도립국악단 (2015~2016) 상임지휘자를 역임했고, 올해 1월에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제14대 단장으로 취임했다. 3월 23일, 세종M씨어터에 오르는 서울시국악관현 악단의 신춘음악회 ‘청청(淸靑)’에서는 직접 지휘봉을 잡는다.
“7~8년 정도 고민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 음악의 구조를 알겠고, 지휘자로서의 ‘해석’을 하게 되더군요. 한국음악에 대한 고민으로 세월을 보내니 한국음악을 바라보는 저만의 ‘패러다임’이 생기기도 하더군요. 작품이란 수도의 결과이고, 지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밀한 자신의 세계로 한 발자국씩 다가서는 게 아닐까요.”
한국음악의 보이지 않는 원리와 의미를 탐구했던 그가 지휘를 하면서 얻은 지론 중 하나는 ‘장단’과 ‘내면’의 세계이다.
“한국음악에는 타악기가 연주하지 않을 때에도 음악의 기운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장단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잘 살려주어야 음악이 생동감을 입습니다. 그리고 음악의 이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김철호 단장이 음악을 풀어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전통음악의 호흡을 가시화하는 것이다. 인터뷰 도중 눈앞에서 보여준 그의 손목의 움직임과 손끝의 방향은 ‘이곳을 쳐다보며 따르라!’라는 외침이 아니라, ‘음악 깊은 곳의 호흡과 장단감을 깨워라’라고 말하는 듯, 허공에서 넘실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