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 가면 <렌트>가 보인다
뮤지컬과 여행 이야기
writer 원종원(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뮤지컬평론가)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뒤섞인 대도시 뉴욕. 뮤지컬 애호가들에게 뉴욕은 마성의 도시다.
하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뉴욕의 젊은 예술가들의 고달픈 삶과 사랑도 애잔하게 자리 잡고 있다. 뮤지컬 <렌트>처럼.


어느 국가나 그 나라를 상징하는 도시가 있다. 대한민국은 서울이 그렇고, 일본은 도쿄가, 영국은 런던이, 프랑스는 파리가, 이탈리아는 로마가 그렇다. 물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곳 말고도 아름답고 정겨운 곳이 많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나라의 젊은이들이 가고 싶은 곳이자 젊음과 예술, 문화와 역사가 공존하는 장소라는 단서를 달면 이들의 존재감은 무시하기 힘들다. 요즘 광고 문구에서도 나오는 말처럼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간 사람은 드문” 곳이다. 미국 사람들에겐 아마도 맨해튼이 그런 공간일 것이다. 미국 사람들에게조차 뉴욕은 외국 같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볼 것 많고 즐길 거리도 많은 특별한 장소라는 의미일 것이다. 일 년 사시사철 방문객들로 넘쳐나는 타임스 광장, 허드슨 강을 따라 이어지는 넉넉한 조깅 코스, 브루클린 다리의 석양, 하늘을 찌를 듯한 마천루, 늘 북적대는 도심, 일방통행을 가득 메운 옐로우 캡, 센트럴 파크, 그리니치 빌리지, 소호, 차이나타운, 이탈리안 거리 심지어 32번가의 한국 거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뒤섞이며 만들어내는 대도시의 정경은 말 그대로 역동적이고 매력 넘친다.

뉴욕의 그래피티 아트
특히, 뮤지컬을 좋아하는 애호가들에게 뉴욕은 비할 데 없는 마성의 도시다. 골목을 돌아설 때마다 입이 딱 벌어지게 만드는 씨어터 디스트릭트의 공연장들은 입간판만으로도 호화롭기 그지없다. 빌보드가 즐비한 TKTS 부스 위 계단에 앉아 도시 정경을 바라보자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기 일쑤다. 하지만, 동전에도 양면이 있는 것처럼 화려함의 이면에는 늘 빈곤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뉴욕의 젊은 예술가들에게 삶이란 고달픈 일상의 반복이다. 춥고 허기지지만 가장 힘든 것은 역시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는 세상살이와 창작의 고통이다. 오죽하면 NYU(뉴욕 대학교) 졸업식에 특별 연사로 참여한 명배우 로버트 드니로는 “예술가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이제 당신 인생은 X됐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농반진반의 유머 섞인 표현이겠지만 풍자 속에 담긴 그들의 현실과 상황이 쓴웃음을 짓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들은 물질적인 충족보다는 정신적인 만족을 꿈꾸며 산다. 세상은 참으로 아이러니의 연속이다. 뮤지컬 <렌트>는 바로 그런 뉴욕의 젊은 예술가들의 삶과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글세’ 혹은 ‘월세’쯤 된다. 집주인에게 월세 내는 것이 지상 최대의 고민거리인 사람들, 꿈은 높지만 현실은 고달픈 뉴욕 청춘 군상들의 이야기라 붙여진 제목이다. 장르와 형식을 뛰어넘는 콘텐츠의 재가공이 현대 문화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방식이라면, 아마도 뮤지컬 <렌트>는 가장 전형적인 사례일 것이다. 원작은 오페라이고, 무대와 스크린을 넘나들며 인기를 누려왔기 때문이다.

뮤지컬 <렌트>

뮤지컬 <렌트>
기본 골격은 푸치니의 오페라 <라 보엠>이다. 1800년대 파리를 배경으로 젊은 시인 루돌프와 바느질로 연명하는 가난한 처녀 미미의 슬픈 사랑을 그린 <라 보엠>은 ‘그대의 찬 손’, ‘무제타의 왈츠’ 등 주옥같은 아리아로 유명하다. 뮤지컬에서는 이야기의 시공간을 과거 파리에서 현대 뉴욕으로 탈바꿈시켰다. 덕분에 주인공들의 직업도 화가나 시인, 성악가에서 로커, 영화감독 지망생, 밤무대 모델, 대학의 시간강사, 행위예술가 등으로 탈바꿈됐다. 요즘 뉴욕 젊은 예술가들의 그 모습 그대로인 셈이다. <렌트>는 실험과 파격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라 보엠>에서 젊은 예술가들을 괴롭힌 것이 가난과 추위 그리고 결핵이었다면, 뮤지컬로 만들어진 <렌트>에서는 HIV 바이러스와 에이즈, 동성애나 양성애, 그리고 대도시의 사악한 물질만능주의가 등장한다. 덕분에 뮤지컬은 낭만적인 오페라보다 더 현실적인 내용으로 탈바꿈됐다. 하지만 직설적이고 과감한 소재의 선택은 오히려 요즘 신세대들로부터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래서 더 실감 나고 흥미로운 작품으로 받아들여지게 됐다. 오프 브로드웨이의 소극장에서 초연됐던 탓인지 <렌트>는 화려한 볼거리보다 중독성이 강한 음악으로 더 유명하다. 변화 없는 단출한 소규모의 원 세트는 열혈 마니아들 사이에서 이른바 ‘렌트 정신의 구현’이라 불리며 이 작품만의 매력으로 평가받는다. 가난한 예술가들의 삶과 사랑을 다룬 줄거리는 화려하지 않은 세트가 훨씬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편, 뮤지컬에 등장하는 대부분 노래들은 록이나 발라드 등 요즘 세대들이 익숙하게 즐기는 장르로 꾸며졌다. 덕분에 고전 속 이야기는 그대로 살려두면서도 MTV에 길들여진 신세대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음악적 공감대를 지니게 됐다. 공연 못지않은 음반의 인기도 이런 배경 탓이다. 두세 번쯤 반복해 듣다 보면 함께 흥얼거릴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익숙해지면서도 아름다운 멜로디가 이 작품의 묘미이자 거부할 수 없는 매력 포인트다.

뮤지컬 <렌트>
<렌트>는 제작자인 조나단 라슨을 빼고 말하기 힘들다. 그 스스로가 뉴욕의 가난한 젊은 예술가였던 라슨은 뮤지컬이 시작되기 하루 전날, 서른다섯의 젊은 나이에 급성 대동맥혈전으로 세상을 떠났다. 지나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 <렌트>의 주된 모토는 ‘오늘밖에 없다(No Day But Today)’라는 문구로 빈곤하고 어려운 대도시의 일상 속에서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페라와 달리 마지막 장면에서 미미가 죽지 않고 되살아나는 것도 바로 이런 주제의식 때문이다. 하지만 누구도 라슨의 삶이 이 메시지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결국 조나단 라슨은 작품을 통해 예견된 삶을 살다 느닷없이 우리의 주변을 떠난 전설적인 인물로 남게 됐다. 뮤지컬 영화는 2005년 만들어졌다. 무대 버전의 뮤지컬이 처음 등장한 것이 1996년이었으니 꼭 10년 만에 시도된 변화다. 연출은 <나 홀로 집에>, <해리 포터>, <나인 먼스>, <판타스틱 4> 등으로 유명한 크리스 콜럼버스가 맡았는데, 대부분의 초연 배우들을 스크린에서도 다시 기용해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세트도 활용되긴 했지만, 영화 곳곳에 등장하는 뉴욕의 거리 풍경들은 이 작품의 열혈 추종자들에겐 놓치면 안 되는 뉴욕의 명소가 됐다. 영화의 첫 장면에 나오는 네덜란더 극장의 풍경에서 마크의 다큐멘터리에 간간히 비치는 5번가와 크라이슬러 빌딩, 듬성듬성 그래피티가 그려져 있는 지하철 풍경 등이 대표적이다. 1996년에 발매된 오리지널 뉴욕 캐스트의 두 장짜리 음반에는 이색 보너스 트랙도 담겨 있다. 시각장애인 가수 스티비 원더가 출연진과 함께 부른 ‘Seasons of Love’다.
NYU(뉴욕 대학교)가 있는 그리니치 빌리지를 활보하며 음악 감상을 하는 것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을 만큼 매력 넘친다. 영혼마저 울린다는 스티비 원더의 하모니카 소리는 금상첨화다. 감상해 보길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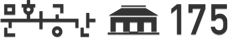

























뉴욕의 그래피티 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