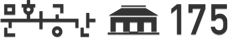요조의 책방 <책방무사>
writer 요조(가수이자<책방무사>의 주인장)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읽은 것에 대해 말이 없다. 책을 읽은 즐거움을, 우리는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자신만의 느낌으로 간직하고자 한다. 그것은 책에서 그다지 화젯거리가 될 만한 내용을 찾지 못해서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느낌을 발설하기 전에 시간을 두고 설익은 생각을 가다듬으며 농익도록 뜸을 들이느라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순간의 침묵은 우리 내면의 풍경을 드러낸다. (…) 책을 읽었으되 우리는 말이 없다. 책을 읽었기 때문에 말이 없는 것이다. 설사 생각지도 못한 감시병이 튀어나와 “어때? 재미있어? 이해가 되니? 뭘 느꼈는지 얘기해봐!”라고 심문을 일삼는다 한들 우리에게서 답변을 끌어낼 수는 없을 것이다.
– 다니엘 페낙, <소설처럼> 중에서

-
저는 작년 가을 즈음부터 서울 종로구 북촌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서점 주인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책들을 추천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인용했던 글에서 처럼 책을 다 읽고 나서 뭐라 표현할 길이 없는 감동에 할 말을 잃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저를 막막하게 했던 많은 책 가운데 최근에 읽은 두권을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두 권 다 동화책입니다. 첫 번째 책은 오나리 유코의 <행복한 질문>입니다.
서로 무척 사랑하는 커플이 나누는 질문과 답변이 전부인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울었습니다. 울면서도 참 신기했습니다. ‘이상하다. 나는 이렇게 감상적인 사람이 아닌데.’ 신기해서 친구에게 이 책을 읽혀보았습니다. 친구도 울더군요. 그리고는 똑같이 “이상하다, 나는 이런 내용에 우는 사람이 아닌데”하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책을 소개하면서 저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저는 울었습니다. 제 친구도 울었습니다.”

오나리 유코 글·그림 / 김미대 옮김
북극곰 / 1만 5천원
-
두 번째 책은 정미진 작, 구자선 그림의 <휴게소>라는 책입니다.
애완동물들이 긴 여행을 떠나기 전에 들르는 휴게소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읽다가 끝부분에서 코끝이 찡해져 오더군요. 그리고는 이 책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 책의 소개를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저는 울뻔했습니다.” 혹시 몰라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의 소감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구체적인 언급 없이 ‘울 뻔했다’는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마 그 어디에서도 이런 책 소개 글은 읽은 적이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울었다’, ‘울 뻔했다’ 이게 소개의 전부라니, 제가 쓰면서도 참 무책임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책을 이렇게 엮어본 것은 ‘울었다’와 ‘울 뻔했다’ 사이가, 그 짧은 찰나가, 이토록 분명하게 나뉘는 경험이 저에게는 아주 흥미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책을 팔면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행복한 질문>을 읽고 ‘울었고’, <휴게소>를 읽고는 ‘울 뻔했’답니다. 자, 이 요상한 임상실험에 내키신다면 동참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외도 생기고 변수도 생기고 하면서 이 작은 임상실험이 조금씩 풍성해지는 것을 보고 싶네요.

정미진 글 / 구자선 그림
atnoon books / 1만 5천원
-

오나리 유코 글·그림 / 김미대 옮김
북극곰 / 1만 5천원
-

정미진 글 / 구자선 그림
atnoon books / 1만 5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