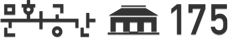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은
옥상 밭 고추에도
글. 장우재(극작가)
너에겐 사소할지 모르지만 나에겐 큰 것들의 목록이 서로 너무 많이 다릅니다.
다양성이 아니라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진딧물처럼 옥상 밭 고추에게까지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조금 더 아파해야할 것 같습니다.

1.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이다.” 페드라 켈리.(“The personal is political.” by Petra Kelly) 〈옥상 밭 고추는 왜〉의 부제는 ‘Ethics Vs. Morals(에틱스 대 모럴스)’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윤리 대(對) 도덕’ 쯤 되겠지요. 하지만 굳이 영어로 쓴 이유는 우리에게 ‘윤리’와 ‘도덕’은 거의 비슷한 말처럼 다가오고 그것의 차이를 말하자면 여러 설명을 덧붙여야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몇 번 설명을 해보았으나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직 내 자신도 내 말로 잘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잘 알고 있지는 못하구나, 생각도 해봅니다.
‘모럴(moral, 도덕)’이란 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정한 (사람이란 기준 아래) 우리 모두가 공히 지켜야할 어떤 룰(rule, 규칙) 같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입니다. 그러나 ‘에틱스(ethics, 윤리)’란 사회 이전에 어떤 거주지에 사는 인간들이 각자 스스로 한 인간으로서 지키고 싶은 어떤 룰로 생각됩니다. 강조점은 ‘사회 이전에’, ‘스스로 지키고 싶은’ 입니다. 곤란스럽지만 이런 식으로나마 제목을 붙이고 싶었던 이유는 최근에 제가 느끼기에 이 사회는 모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있고, 또 이러한 상황 속 모럴에 대해 각자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또 이전에 우리가 믿고 따라왔던 모럴의 겉과 속이 지나치게 분리되어 아무도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또 그 모럴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기준으로서 에틱스 또한 모두가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리 잡지 못하고 미완의 형태로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나 스스로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것부터’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얘기 모두를 덮어버리는 것으로 ‘어찌됐든 살아남아야 한다.’도 있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 잣대를 들고 지금 현재 우리와 이 사회를 들여다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살아남는 것(survive)’이 아니라 ‘살고 있는(live) 법’을 찾기 위해서 이 극을 지었습니다.

2.
연극 작가로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희곡을 쓰고 연극을 만들면서 했던 생각 중 하나는 ‘말의 흡입력은 너무도 세구나.’였습니다. 단지 대사가 아니라 관객이 공연을 보고 ‘그래서 뭔 말을 하고 싶은 건데?’라고 할 때 그 말 말입니다. 메시지라고 해야 할까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도 깊어서 알 수 없는 인간의 속마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구?’ 관객은 묻는 겁니다. 그 때 ‘제 생각에 답은 이겁니다.’라고 한마디 말이 있어 준다면 관객은 얼마나 위안이 될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은 이게 문제가 있어.’라고 바로 지적이 나올 겁니다. 말은 어쩌면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것을 바라는, 영원히 뒤척이는 염원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과도해진 말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말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것을 희망하며 방법을 찾다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가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틱스’와 ‘모럴’이 격돌하는 장을 만든 겁니다. 연극에는 ‘싸움’이 있어야하고 그것을 괜히 문학을 핑계를 대면서 아는 체 넘기는 것은 저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옥상 밭 고추는 왜〉를 조금 더 설명하고 싶습니다.
3.

보통 극에는 프로타고니스트(protagonist, 주인공)와 그에 반하는 안타고니스트(antagonist, 적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작가는 어느 편인가 관객은 궁금할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작가는 인물들의 ‘관계’를 통해서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그 ‘관계로 말하기’를 위해 ‘모럴’에 해당되는 인물(재란, 현수, 성복, 수환)을 설정하였고, 그 모럴과 언제나 따라 붙어있는 -함축된- ‘생존’을 중요시 하는 인물(현자, 성, 정, 충, 모범택시 기사들, 성식)들이 등장하고, 이들은 알게 모르게 서로 얽혀 지내고 있습니다. 또 ‘모럴’과 대립하는 것으로 ‘에틱스’를 놓고 이를 중요시하는 인물로 현태, 동교, 균, 구, 쏘가 자리 잡고, 그와 따라 붙어 있는 -함축된- ‘엘리트주의’를 갖고 있는 광자, 지영, 주연, 경찰이 자리 잡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럴, 에틱스, 생존, 엘리트주의, 이렇게 총 네 개의 항이 생깁니다. (그레마스의 기호 사각형을 참조한 것입니다.) 이때 (이를 사각형의 각각 꼭짓점에 놓으면) 모럴과 에틱스는 서로 대립하게 되고 에틱스와 생존은 모순적인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모럴과 엘리트주의도 모순적인 관계가 됩니다. 너무 도식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극을 발생시키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구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구조 짓기를 통해서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모럴을 얘기하지만 실은 생존에 묶여 있는 현자와 재란. 에틱스를 바라지만 결국 엘리트가 되어야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지영. 그래서 동교와 이별. 또 어쩌면 살면서 그렇게 부딪힐 일이 없었던 생존을 중요시하는 현자와 매일 매일 진딧물을 잡아야만 한다는 성자(엘리트)같은 광자와의 싸움. 그것을 그저 지나칠 수 없어 사과는 받아야겠다는 에틱스의 현태와 생존의 현자와의 그 양립할 수 없는 모순적인 실존. 제 아무리 도덕적이라지만 ‘쓰레빠’를 끌고 그런 식으로 밖에 사는 방법을 모르는 성식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말하는 수환까지. 네 개의 항으로 펼쳐지는 경우의 수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이 공간, 이 혼돈이 어쩌면 현재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보았던 것입니다.


4.
지난겨울, 이러한 극 짓기에 골몰하여 광장에 나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물줄기가 제 자리를 찾기 위해 온 몸을 뒤척인 후 공연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내심 이제 우리에게 이러한 혼돈을 마주 대할 용기와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낯 뜨겁고 불편하지만 혼돈 속에서 눈을 비벼가면서 우리의 민낯과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모순 혹은 대립적인 관계 속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이면까지도 볼 수 있는 이성, 싫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려있는 심장이 이제 도착할 것만 같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공연을 올리는 이 시점, 우리는 아직 이 혼돈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뜨거운 손을 마주 잡기에는 청산해야 할 안 좋은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에겐 사소할지 모르지만 나에겐 큰 것들의 목록이 서로 너무 많이 다릅니다. 다양성이 아니라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진딧물처럼 옥상 밭 고추에게까지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조금 더 아파해야할 것 같습니다. 조금은 이 불편을 끈덕지게 포기하지 않고 가져가야할 것 같습니다. 〈옥상 밭 고추는 왜〉 재공연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