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문화회관에는 왜 예술단이 많을까?
글. 이승엽(세종문화회관 사장)
세종문화회관에는 9개의 서울시립예술단이 있다. 공연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려니 한다.
공연예술인들은 오래전부터 그랬으니 또 그러려니 한다. 유럽이나 미주의 공연예술인들은 신기해한다.
그쪽 사정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세종문화회관에는 9개의 서울시립예술단이 있다. 장르별로 연극, 무용, 오페라, 뮤지컬, 국악관현악, 합창 등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시립 단체들이다. 그 외에도 청년이나 어린이들로 구성된 예술단이 셋 더 있다. 이렇게 다 합치면 9개가 된다. 10여 년 전에 서울시립교향악단이 독립한 이후에도 9개의 예술단은 세종문화회관이라는 우산 아래 함께 운영되고 있다. 공연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려니 한다. 공연예술인들은 오래전부터 그랬으니 또 그러려니 한다. 유럽이나 미주의 공연예술인들은 신기해한다. 그쪽 사정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예술 환경은 서구의 영향을 직접 받았다. 공연예술도 마찬가지고, ‘공연예술의 꽃’이라고 부르는 극장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극장이 서구의 문화와 관행의 연장선에 있다. 극장의 형태와 운영, 프로그램 등이 그렇다. ‘서양 것’으로 따로 구분되는 것들이 두어 세대를 거치며 이런저런 구분이 필요 없게 되었다. 그냥 우리 것이 된 것이다. 극장만 보더라도 그렇다. 서양의 예술적 전통을 수용한 극장이라는 공간이 우리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중 하나가 세종문화회관과 같은 공공극장이 성격이 다른 여러 장르의 예술 단체를 대거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점이다. 서구의 눈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들 방식으로 보면 각 극장은 콘텐츠를 생산하는 주체로 예술가 집단을 두는 것이 자연스럽다. 오페라하우스라면 합창단, 무용단, 교향악단 그리고 성악가를 고용한다. 오페라하우스의 오페라, 발레 시즌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술가들이다. 연극을 주로 공연하는 극장이면 연극 작업에 필요한 예술가를 고용한다. 콘서트홀은 콘서트홀대로 관련된 예술가 집단을 고용한다. 세종문화회관처럼 성격이 다른 장르의 9개 예술단을 두는 경우는 없다.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단
우리나라에서는 세종문화회관만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극장인 국립극장도 그렇다. 2000년 이전의 국립극장에는 7개의 예술단이 전속 단체로 소속되어 있었다. 연극, 무용, 발레, 오페라, 창극, 국악관현악, 합창 등 7개의 예술단과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입주 단체로 활동하고 있었다. 지금의 세종문화회관과 비슷하다. 현재 존재하는 국립예술 단체 중 2010년에 만든 국립현대무용단을 제외한 모든 국립예술 단체가 국립극장에 모여 있었다. 지역의 주요 광역 단위 지방정부도 비슷하다. 심지어 21세기 들어서도 전속 예술단을 만들어 리스트를 더 길게 만들기도 한다.
이에 비해 1990년대에 들어 건립된 공공극장들 대부분은 큰 규모와 화려한 외관에도 불구하고 단출하게 운영되도록 설계되었다. 예술의전당이 대표적이다. 예술의전당 사이트 안에는 많은 예술 단체가 있지만, 모두 예술의전당 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예술의전당만 보면 내부에 예술 집단이 전혀 없다. 경영과 효율의 개념이 대두된 시기 이후에 들어선 공공극장의 전형적인 형태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구도 마찬가지다. 세종문화회관이나 국립극장과는 딴판이다.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이런 현상은 우리의 70년 예술 정책사를 통해 설명할 수밖에 없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초반의 우리 예술계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다. 특히 한꺼번에 큰 투자가 필요한 인프라는 열악하기 그지없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극장 수는 모두 1천 개가 넘는다. 그중 절반이 공공극장이다. 공공극장이 대체로 규모가 큰 편이어서 객석 수를 감안하면 공공극장의 비중은 70%에 육박한다. 그런데 이 공공극장의 대부분이 1990년대 이후에 개관했다. 그 이전에 운영되던 우리나라 공공극장은 국립극장과 주요 도시에서 운영하던 시민회관이 거의 전부였다. 서울시에는 1978년 개관한 세종문화회관과 그 전신으로 1961년에 개관한 시민회관이 있었다.
신생국인 데다 나라 살림이 어려운 만큼 예술 정책도 보잘것없었다. 오랫동안 인프라를 늘릴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쉬운 것은 공공예술 단체를 만드는 것이었다. 장르별로 만들어진 예술단은 마땅한 공간이 없으니 운영 중인 공공극장으로 몰렸다.
국립극장이 만들어진 해가 1950년인데, 그해 창단한 예술단은 극단밖에 없다. 그 후 창극단·무용단·오페라단이 1962년에, 국립교향악단이 1969년에, 발레단과 합창단이 1973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악관현악단이 1995년에 창단되었다.

서울시극단
그리고 이들 단체는 모두 국립극장을 근거지로 삼았다. 남산에 지금과 같은 형태의 본격적인 극장을 마련한 것이 1973년이니 대부분의 예술단이 그 이전에 만들어진 셈이다. 그 이전에는 지금 명동예술극장으로 운영되는 건물을 국립극장으로 사용했었다.
서울시와 세종문화회관 사정도 비슷하다. 창단이 오래된 순서로 뮤지컬단(1961년), 소년소녀합창단(1964년), 국악관현악단(1965년), 무용단(1974년), 합창단(1978년), 유스오케스트라(1984년), 오페라단(1985년), 극단(1997년), 청소년국악단(2005년) 등이 차례로 활동을 시작했다. 2005년 세종문화회관 전속 단체에서 재단법인으로 독립한 서울시립교향악단은 그 창단을 1948년으로 삼고 있다.
결국 한국의 몇몇 공공극장이 다양한 장르의 전속 단체를 두고 운영하는 것은 공연시장에서 인프라(극장) 확장이 공연 단체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데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다. 이로써 지금은 우리 주변에 많은 공공극장이 있지만, 세종문화회관처럼 전속 단체를 두는 경우가 별로 없는 사실이 설명된다.
세종문화회관의 지금 구조는 우리 사회와 예술 정책의 특별한 형편을 반영한 시간의 축적인 셈이다. ‘한국형 제작극장’이라 부를 만하다. 그러니 운영도 그에 맞춰야 할 것이다. 살길도 그 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세종문화회관의 미래 계획도 그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맞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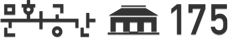

























세종문화회관 대극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