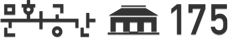극장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디자인들
공연과 극장을 더욱 생기있고 매력적으로 만드는 디자인이 있다.
세종문화회관의 공연 포스터와 미디어 파사드, 그 뒷이야기를 들어보자.

일월오봉도와 브로크만
〈세종음악기행〉 포스터 읽기
글. 원승락(세종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
‘세종대왕은 위대한 예술가다’라는 식의 전형적인 찬양을 곁들이지 않더라도 그가 수학적인 사고를 한 것은 틀림이 없다. 한글에 위상수학의 알고리즘이 절묘하게 적용되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반복적인 수열의 조합 속에 창의적인 배열은 매우 아름다운 화성을 만든다. 산수ADHD(주의력결핍-과 잉행동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논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디자인도 기존의 교과서적인 문법을 어떻게 영리하게 접목시키는가가 매력적인 디자인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사실 디자이너에게 동양적 혹은 한국적이라는 고정관념은 박자가 맞지 않는 음악과도 같다. 남성적인 서양, 여성적인 동양, 덜 규칙적인 동양, 여백의 미. 이런 고정관념은 가치의 우열을 떠나 적어도 디자인에 있어서는 매우 비효율적이다. 전통적이라는 것은 상당 부분 현재가 만들어 놓은 편안한 과거인 경우가 많다.
수학이 서양의 전유물이 아닌 것처럼 모던한 동양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출발선에서 〈세종음악기행〉 포스터 디자인은 시작됐다. 조선 시대 왕이 앉던 어좌 뒤에 놓인 병풍인 일월오봉도의 일부를 차용했고, 과거의 모던한 클래식 느낌을 주기 위해 요셉 뮬러 브로크만이 디자인한 1950년대 톤할 레의 취리히 음악홀(Zurich Tonhalle)의 ‘뮤지카 비바(Musica Viva)’ 포스 터를 오마주했다. 브로크만의 작업은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매우 수학적이고 건축적이면서 기하학적인 인터내셔널 스타일의 교과서로 불린다. 어쩌면 오리진과 모더니즘이라는 얼핏 조화되기 어려운 요소의 아교 역할에 그리 나쁘지 않은 선택지였다고 믿고 싶다. 추가적으로, 일월오봉도의 차용에 있어 일월은 모던하게 연역했으나 문제는 오봉이었다.
“어떤 이는 오봉에서 삼각형을 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오봉을 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세종음악기행을 보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지 않으련다.”



밤으로의 초대, 미디어 파사드
글. 신대섭(세종문화회관 문화재원팀) / 자료 제공. 현대자동차
도시의 밤이 찾아오면 광화문광장 맞은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전면은 미디어아트 전시장으로 탈바꿈한다. 일상과 예술, 그 경계를 허물기 위해 2015년 11월부터 세종문화회관은 ‘세종 현대 모터갤러리’라는 미디어 파사드를 운영하고 있다. 1978년 개관 이래 건축물에 대한 이미지 변화를 생각해온 세종문화회관은 한국 전통성의 상징이자 기념비적인 건축물에 생명력을 부여하고자 현대자동차와 협업을 시작했다. ‘미디어 파사드’란 건물 외벽에 LED 조명을 비춰 영상을 투사하는 기법으로, 세종문화회관 외벽에 국내외 미디어아트 작가의 영상물을 상영함으로써 건축물에 생기를 더하고 광화문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서울의 이미지를 선사하고 있다.
해가 지고 점차 어둠이 깔리면 대극장 기둥 사이로 다섯 개의 대형 전동 스크린이 내려와 국내외 미디어아트 작가들의 영상물이 두 가지의 테마로 상영된다. 하나는 ‘브릴리언트 시티(Brilliant City)’라는 주제로 이용백, 홍 경택, 한계륜, 임영길, 유니버설 에브리씽(Universal Everything)이 작가로 참여했다. 도시의 풍경과 그 속에 살아 숨 쉬는 사람들의 일상을 새롭게 포착함으로써 관객들로 하여금 빛나는 자신만의 순간을 되돌아보게끔 한다. 또 다른 하나는 ‘브릴리언트 라이트(Brilliant Light)’라는 주제로 한창민, 이이남, 이수동, 류호열, 빠키 작가가 참여했다. 도시의 밤이라는 평범한 일상에 희망의 빛을 더해 특별한 순간과 따뜻한 위로, 꿈을 선물한다.
어쩌면 예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어느 시대에나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해왔다. 바쁜 퇴근길, 잠시 걸음을 멈추고 세종문화회관을 바라보면 우리의 일상을 반짝이게 할 빛의 향연이 펼쳐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