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람 되기는 힘들어도 괴물이 되지는 말자
창작 뮤지컬 <서울의 달>
writer 이다윗(작가) / photo 김호근(서울사진관), MBC 제공
창작 뮤지컬 <서울의 달>은 2016년, 사람들의 모든 욕망이 집결되어 있는 서울 한복판에서 시작된다.
이 작품은 과거를 돌아보며 추억하는 복고 취향의 뮤지컬이 아니다.
지금, 여기를 들여다보며 새로운 삶을 이야기하는 동시대의 뮤지컬이다.

1994년, 서울 그곳은…
내 기억에 1994년은 그럭저럭 괜찮은 해였다. 문민정부 집권 2년 차. 30여 년간 지속되어 온 권위주의적 통치를 종식시킨 대통령은 기왕에 시동을 건 개혁 드라이브에 더더욱 박차를 가했고, 이에 호응하듯 사회의 전 영역에서 변화의 바람이 일었다.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희망, 어쩌면 우리도 선진국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너도나도 축포를 쏘아 올렸다. 그 무렵, 서울엔 긍정적인 기운이 가득했다. 곳곳에서 돈이 흘러넘쳤고, 사람들은 벌건 눈으로 돈을 좇기 바빴다. 그러는 사이, 압구정 오렌지족 청년이 친부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지존파라 불리는 희대의 살인마들이 등장해 특권층에 대한 증오를 선연히 드러내며 온 나라를 공포에 떨게 했지만 어디까지나 특정 개인, 혹은 특정 세대의 일탈로 선을 긋는 분위기였다. X세대라는 부정적인꼬리표가 붙은 젊은 층들의 소비문화와 당대 유행하던 홍콩 누아르 영화가 끔찍한 세태의 주범으로 지목되었을 뿐이다. 그 무엇도 사회 전체에 감돌던 낙관적인 기류에 큰 흠집을 내진 못했다. 어쨌거나 시대는 변하고 있었고, 사회는 발전하고 있었으며, 역사는 진보하는 듯 보였다. 그렇게 눈앞에 다가온 성공에 다들 눈이 멀어 휘청거리던 그해, <서울의 달>이란 제목의 드라마 한 편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이상한 드라마였다. 주인공의 직업은 제비족이었고, 달동네와 카바레, 음험한 뒷골목이 드라마의 주 무대였다. 온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주말 드라마에 19금 영화를 방불케 하는 인물과 설정이 등장한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었는데, 결말은 더더욱 충격적이었다. 주인공이 조폭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는 것으로 드라마는 끝이 났다. 이토록 어둡고 심지어 비극적이기까지 한 드라마에 당대의 시청자들이 왜 그렇게 열광적으로 반응했을까. 성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주인공 홍식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 아닐까. 홍식이 성공을 향해 손을 뻗을수록, 그토록 꿈꾸던 황금의 땅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의 내면은 공허해져만 갔고, 알 수 없는 불안이 텅 빈 내면을 채워 갔다. 마침내 황금의 땅에 깃발을 꽂았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바로 죽음이다. 음침한 뒷골목에서 쓸쓸히 최후를 맞는 홍식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초라한 민낯을 발견했고, 그의 상처와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느끼고 받아들였다. 모두가 성공에 도취해 축배를 들 때, <서울의 달> 작가는 그 너머의 불안을, 앞으로 닥칠 비극을 넌지시 가리켰다. 이에 답하듯 드라마가 종영할 무렵,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발생했고, 그 이듬해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 그리고 몇 년 뒤, IMF가 터졌다. 그 모든 게 신기루였음을 깨닫기까지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낙관적 전망으로 가득했던 1990년대는 그렇게 침몰해 갔다.

왼쪽부터 이승재, 최민식, 박성훈
2016년, 서울 이곳은…
2016년의 서울은 어둠, 그 자체다. 수십 년간 사회를 지탱해온 신화는 모두 파괴되었고, 신화가 뿌리 뽑힌 자리에는 이제 환멸과 증오만이 가득하다. 이제 그 어떤 말로도 이 시대 청춘들의 마음을 현혹시킬 수 없다. 현혹은커녕 위로조차 할 수 없다. 아직도 꿈을 말하며 ‘노오력’을 강조하는 ‘꼰대’ 어르신들에게 청춘들은 냉소로 화답할 뿐이다. ‘노오력’만으로 안 되는 세상이란 걸 알아 버렸기 때문이다. 최근 이 나라의 VIP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충격적인 사건들은 세상에 대한 청춘들의 부정적 인식을 너무도 자명한 진리로 확인시켜 주고 있다. 꿈도, 환상도, 비전도 이제는 모두 부질없는 망상이 되어 버렸다. 오죽했으면 ‘헬조선’이란 표현까지 등장했을까.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20년도 더 된 <서울의 달>이란 원작을 다시 꺼내야 하는 이유는 뭘까. 나는 그 답을 찾아야 했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프랑스의 시인, 폴 발레리의 묘비에 적힌 글귀다. 어느 날, 광화문을 걷고 있는데 마주 보이는 보험회사 빌딩에 이 구절이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다. 물끄러미 글귀를 보다가 나도 모르게 중얼댔다.
“바람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바람이 안 불어도 살아야 돼. 태어난 이상, 어떻게든 숨 쉬고 살아야 한다고. 몸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살아야 한다고. 그래서 더 죽겠다… 살라니까 아주 죽겠다….”

내 처지를 비관하며 불평하듯 툭 던진 말에서 문득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살자. 어떻게든 살아 보자…. 살아내는 것, 그것으로 족하다.”
태어난 이상,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절대자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태어난 것도 아니며 위대한 업적을 이루기 위해 태어난 것도 아니다. 그딴 소리는 이제 그만하자. 지겨워 죽겠다. 태어났으니 그냥 살아야 하는 거다. 하나의 생명체로 이 땅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축복이며 이미 그것만으로 우리는 태어난 목적과 사명을 다한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대본 속에 고스란히 담겼다. 빌딩의 현란한 불빛들을 바라보며 주인공 홍식이 번쩍거리는 랜드마크 하나 제대로 세울 거라며 자신의 원대한 꿈을 이야기하자 그의 고향 친구, 춘섭이 이렇게 답한다.
“뭣을 자꾸 이룰라 그랴. 아, 태어난 순간, 다 이룬 것이여…. 태어나서 숨 쉬고 사는 거… 고것으로 사람은 이미 인생의 목적을 달성해분 것이랑게…. 나머지 인생은 그냥 덤이여, 덤!”
왜 지금 이 시점에 <서울의 달>을 다시 만들어야 할까. 그것도 뮤지컬로. 82부작 드라마를 하나하나 뜯어보며 스스로에게 계속 던진 질문이다. 답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었다. 이곳, 서울에는 아직도 살기 위해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청춘이 있고, 청춘들의 욕망을 먹고 자라는 괴물 같은 도시가 있다. 그렇다. 홍식과 춘섭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작품의 시점을 2016년, 현재의 서울로 옮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꿈꾸지 말자. 이 시대를 견디고 있는 동지들에게 간절히 하고 싶은 말이다. 꿈이 얼마나 사람을 허기지게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람을 눈멀게 하는지 잘 알지 않나. 욕망으로 들끓는 이 세상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쩌면 아예 꿈을 꾸지 않는 것뿐일지도 모른다. 꿈 없이도, 목적 없이도 즐겁게 사는 것. 어쩌면 그것이 이 지옥 같은 세상을 향한 최선의 복수일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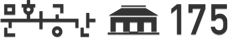


























왼쪽부터 이필모, 한석규, 허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