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과 <스위니 토드>
뮤지컬과 여행 이야기
writer 원종원(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뮤지컬평론가)
뮤지컬 <스위니 토드>는 런던의 플리트 스트리트를 모르고는 절반밖에 감상할 수 없는 뮤지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즐기는 뮤지컬과 여행 이야기 그 세 번째 여행 장소는 바로 런던이다.


뮤지컬 <스위니 토드>
뮤지컬에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미스터리나 서스펜스가 오히려 더욱 멋진 무대로 꾸며질 때가 있다. 소재와 형식이 다양해지면서 이런 이색적인 만남도 흔해지는 추세다. <오페라의 유령>, <우먼 인 화이트>, <잭 더 리퍼> 같은 무대들은 손꼽을 만한 사례들이다. 창작 뮤지컬 <셜록 홈즈 2: 블러디 게임>이나 <프랑켄슈타인>도 마찬가지다. 늘 그렇듯 이런 부류의 작품들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흥미진진한 전개와 극적 반전으로 뒷맛이 오래 남는 강렬한 잔상이 그만의 매력이자 인기 요인이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미스터리 뮤지컬을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스티븐 손드하임의 <스위니 토드>다. 산업혁명 이후 계급 간의 갈등과 빈부의 격차가 극심했던 19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연쇄살인도 불사하는 잔혹한 이발사와 그를 사랑한 나머지 시체를 은닉하기 위해 고기 파이로 만들어 팔았다는 기괴한 파이 가게 여주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증오와 복수에 눈이 먼 주인공이 눈앞에 있는 본질조차 알아보지 못한 채 광기 어린 핏빛 칼날을 마구 휘두른다는 내용은 인간의 욕망과 분노가 얼마나 허망하고 덧없는 것인가를 풍자적으로 보여준다. 불협화음과 파열음, 변박과 변조, 현대 음악을 연상시키는 부조화의 선율과 리듬은 손드하임 특유의 감성적인 가사와 절묘하게 어우러지며 시종일관 극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완성도 높은 재미를 보여준다. 특이하게도 우리나라에선 무대보다 뮤지컬 영화로 더 유명하다. <비틀주스>, <크리스마스 악몽>, <화성침공>, <찰리와 초콜릿 공장> 등을 만들었던 영화감독 팀 버튼이 2007년 선보였던 빅 스크린용 영화의 인기 탓이다. 국내에서 대박 흥행까진 못했지만, 특유의 색채와 독특하고 별스런 감각은 팀 버튼 감독의 추종자들에게 손꼽히는 대표작으로 남게 됐다. 물론 이 뮤지컬 영화는 이미 20여 년 전에 막을 올렸던 무대용 버전의 영상적 진화다. 뮤지컬이 처음 막을 올렸던 것은 1979년의 일이기 때문이다. 학창 시절 이 작품을 보고 심취했던 팀 버튼은 오랜 세월 정성을 기울여 영화 판권을 획득해 제작에 임했는데, 덕분에 영화는 무대와는 사뭇 다른 시각과 변화 그리고 해체와 재구성의 과정을 거쳤다고 평가할 만하다.

마니아 관객 중에는 뮤지컬 영화와 원작을 비교하며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는 등 수수께끼(?)에 열성적으로 도전하는 모습도 보인다. 공연에서도 변화가 더해지긴 마찬가지다. 워낙 유명한 원작이라 무대가 꾸며지는 연도에 따라 제각각 차별화된 재미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아주 클래식한 편곡이 도드라진 오페라 버전이 런던의 오페라하우스 무대를 꾸미는가 하면 배우가 직접 연주하고 노래하는 액터 뮤지션 뮤지컬로 탈바꿈되기도 한다. 2016년 국내에서는 거의 10년 만에 우리말 버전의 앙코르 무대가 꾸며졌으며, 한국 대중들에게 친숙한 번역(오히려 의역에 가까운)과 언어의 뉘앙스를 잘 살린 노랫말이 각광받고 있다. 말장난처럼 들리는 우스갯소리들은 객석의 관객들로부터 폭소를 자아내는데, “신혼부부로 만든 고기 파이에 뿌려야 하는 기름은 아이 러브 유”라든지 “깨끗한 맛이 나는 목사 고기 파이는 한국산도 호주산도 아닌 에덴동산”이라는 표현이 대표적이다. 물론 원작에서는 만날 수 없는, 한국 버전만의 독특하고 재미있는 재해석이다.

템스 강의 타워 브리지
의미 전달에 집중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색채가 연해진 부분도 있다.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근대 런던 거리의 이미지가 그렇다. 유명한 멜로디의 노래 ‘발라드 오브 스위니 토드’에는 ‘악마의 탈을 쓴 이발사’라는 우리말 가사가 등장하는데, 원래 가사는 조금 다르다. 원어 노랫말은 ‘플리트 스트리트의 악마 이발사(Demon Barber of Fleet Street)’다. 플리트 스트리트란 런던 도심 구시가지의 생 폴(St. Paul) 성당에서 코벤트 가든 쪽으로 이어지는 오래된 길의 이름이다.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골목골목으로 꼬불꼬불 이어지는 좁다란 길이 오랜 역사를 품고 있는 듯한 장소를 만날 수 있는데, 영화 <해리 포터>에 나오는 마법사 거리인 다이아곤 앨리를 떠올리면 엇비슷하다. 오래된 골목길이다 보니 길을 돌아설 때마다 사연 많아 보이는 오래된 상점이나 어둑어둑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매력이자 묘미다. 사실 플리트 스트리트는 <스위니 토드> 말고도 여러 뮤지컬 안에서 만날 수 있다. 뮤지컬 <메리 포핀스>에서는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인 뱅크스 지역(원래 은행이란 뜻의 영어 표현인 뱅크(Bank)도 이 지역에서 처음 유래됐다)의 은행을 찾은 아이들이 동전마저 저금시키려는 욕심 많은 은행장을 피해 달아나다 어두컴컴한 이 골목길에서 기겁을 하며 달아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플리트 스트리트
<잭 더 리퍼>나 <고스트 오브 런던>, <지킬 앤 하이드> 같은 작품에서는 어둠이 내리면 정체불명의 범죄 현장이 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또 밀랍 인형관인 ‘마담 투소’를 찾아가면 엇비슷한 분위기의 어두침침한 골목길을 재연한 모습도 만날 수 있는데, 역시 비슷한 역사와 배경 탓이다. 사실 <스위니 토드>는 플리트 스트리트를 모르고는 절반밖에 감상할 수 없는 뮤지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래된 골목길인 탓에 ‘믿거나 말거나’ 식의 기괴한 전설도 많고, 그런 이야기를 모아 무대용 뮤지컬로 꾸민 작품이 바로 <스위니 토드>이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런던을 잘 모르고 이 작품을 통해 처음 거리 이름을 접한 사람들 중엔 플리트 스트리트를 범죄의 온상이나 위험한 거리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직접 찾아가 보면 착각에 불과하다. 오히려 골목길이 너무도 아기자기하고 흥미로운, 그래서 진짜 런던을 알려면 꼭 들러야 하는 장소라는 평가가 더 설득력 있다.
예전에는 신문사들이 밀집했던 번화한 장소로도 유명했었다. 이리저리 기자들이 뛰어다니고, 인쇄기들이 찍어낸 신문을 내다 파는 모습이 분명 활기 넘치는 풍경이었을 것이다. 훗날 식자공이 아닌 컴퓨터로 조판을 하는 자동화 시스템(CTS)이 등장하자 대표적인 정론지인 <더 타임스>가 템스 강가의 값싼 지역인 와핑으로 회사를 옮기면서 신문사들도 하나둘씩 떠나게 됐고, 플리트 스트리트의 명성은 그 열기가 식게 됐다. 세월이 흘러 오늘날에는 ‘전설’과 ‘역사’만 남은 고풍스러운 장소가 되어 기자들은 더 이상 만나볼 수 없지만, 그런 추억을 경험하려는 관광객들은 끊이지 않는 런던만의 독특한 명소가 됐다. 길거리 허름한 카페에 앉아 <스위니 토드>가 있었음직해 보이는 오래된 건물 2층을 바라보며 파이 한 조각을 먹어보는 것만큼 이색적인 체험도 없을 것 같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즐기는’ 뮤지컬의 세계를 이해하고 싶다면 언젠가 꼭 들러보라 권하고 싶은 멋진 장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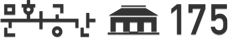

























런던의 생 폴(St. Paul) 성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