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츠부르크와 <사운드 오브 뮤직>
뮤지컬과 여행 이야기
writer 원종원(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뮤지컬평론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즐기는’ 문화와 여행 이야기.
이번엔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로 떠나보자.


모차르트 초콜릿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에는 두 가지 대표적인 관광 상품이 있다. 먼저 모차르트다. 그가 태어나서 유년 시절을 보낸 바로 그 도시다. 덕분에 잘츠부르크에는 모차르트 생가, 어린 시절 가지고 놀았다는 건반악기, 청년 시절 연주하던 성당의 파이프 오르간 등 그의 흔적을 찾아보는 것이 큰 재미이자 볼거리다. 심지어 모차르트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초콜릿도 ‘모차르트 초콜릿’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관광객들에게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간다. 하지만 우습게도 모차르트는 생전에 초콜릿을 먹어봤을 리 없다. 당시까지만 해도 초콜릿은 합스부르크 왕가의 비밀 레시피일 정도로 흔치 않던 음식이었기 때문이다. 사료에 따르면, 마리 앙투와네트가 루이 14세에게 시집가던 해 혼수품 중에 초콜릿을 만드는 비법–그것도 오늘날 흔한 고체가 아닌 핫 초콜릿에 가까운 액체였던-이 있었다고 하니, 평민이었던 모차르트가 초콜릿을 먹어봤을 리 만무하다. 뮤지컬 <모차르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살아생전 잘츠부르크를 벗어나려고 그토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오늘날까지도 잘츠부르크는 그를 통해 큰 관광 수익을 올리고 있는 셈이니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모차르트 못지않은 또 다른 관광 자원이 있다. 바로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이다. 말썽꾸러기 일곱 남매의 새 가정교사인 마리아 수녀가 이들과 음악을 통해 교감하고 새엄마가 되어 결국 나치와 히틀러를 피해 자유의 땅 미국으로 망명을 떠나게 된다는 스토리다. 해마다 명절 때면 안방극장에서 만날 수 있던 이 스토리는 사실 실화다. 실존했던 가족 합창단의 기록인 ‘폰 트랩 가족 합창단 이야기(The Story of the Trapp Family Singers)’를 각색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물론 극적인 구성을 위해 가상의 공간이나 러브 스토리가 더해지고, 손에 땀을 쥐는 추격신도 추가됐지만, ‘진짜’ 있었던 이야기의 무대적 구현이라는 원초적 매력은 크게 다를 바 없다. 물론 이데올로기 논쟁이 격렬했던 냉전 시대의 사회 분위기도 이 뮤지컬이 전대미문의 흥행을 가져오게 된 환경적 요인의 하나다. 일반 대중에겐 영화가 더 익숙하지만, 완성된 뮤지컬로 대중에게 처음 선보인 것은 무대가 먼저였다. 로버트 와이즈가 연출을 맡아 아카데미상 10개 부문을 휩쓸었던 영화는 1965년 제작됐지만, 무대용 뮤지컬은 이보다 6년여 전인 1959년에 처음 막을 올렸었다. 무대 위 주인공은 줄리 앤드루스가 아닌 50년대 최고의 인기 뮤지컬 여배우 메리 마틴이었는데, 훗날 영화에 등장하는 이미지보다 장중하고 느림 템포의 품격 있는 마리아를 연기했던 것이 차이점이자 특징이다. 덕분에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누가 더 실존 인물에 가까웠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흥밋거리가 됐는데,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겐 조금 아쉬울지도 모르지만, 실존 인물은 다정다감하다기보다는 엄격한 면이 많았다는 뒷이야기도 있다. 사실 실제 마리아 수녀는 아이들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는 엄청난 주장도 간혹 만날 수 있다.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전후 사정이 어쨌든, 영화는 글로벌한 흥행을 기록한 대표적인 뮤지컬 영화로서의 명성을 누렸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거리 풍경들은 실제 이야기의 배경이었던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다. 덕분에 지금도 그곳을 찾아가면 모차르트와 함께 <사운드 오브 뮤직>이 최고의 관광 상품으로 남아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호텔이나 숙박시설 중엔 <사운드 오브 뮤직>을 하루 종일 틀어놓는 곳이 있는가 하면, 시내에서 출발하는 사운드 오브 뮤직 관광버스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주요 촬영지로 관광객들을 하루 종일 실어 나르는 것으로 유명하다. 가정교사 마리아가 기타를 들고 음악의 기본인 도레미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알프스 자락의 언덕, 16살 아가씨가 17살이 되기를 기다린다며 뛰어노는 저택 뒷마당의 정자, 마을 높은 곳의 수녀원이나 결혼식 장면에 등장하는 성당 등은 언제나 방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요즘 우리나라 지역 관광에서 한류 드라마 촬영지가 인기몰이를 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물론 관광의 말미에는 어김없이 등장하는 커피숍과 기념품 가게들이 사람들에게 추억을 선물하며 비용을 지불하게 만든다.
사실 50~60년대는 뮤지컬 영화의 전성기였다. 수많은 영화사들이 앞다퉈 무대용 뮤지컬을 영상화했고, 덕분에 글로벌한 흥행도 심심찮게 등장했었다. 우리나라 중장년층들은 뮤지컬 하면 으레 뮤지컬 영화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로 이 시기의 콘텐츠들 속에서 성장기를 보낸 탓이다. 뮤지컬과 영화의 상호 교류는 그래서 나름 역사도 길고 사연도 많다. <사운드 오브 뮤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스크린용 영화가 제작되면서 무수한 뒷이야기를 남긴 것은 이른바 립싱크 파문이었다. 글로벌 마켓으로 ‘상품’을 팔아야 했던 영화사 입장에서는 노래 솜씨 못지않게 인지도가 높은 스타급 배우의 기용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모자란 가창력은 눈속임으로 가려야 했다.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폰 트랩 대령의 노래 ‘에델바이스’나 사랑에 빠진 마리아에게 인생의 조언을 남겨주는 원장 수녀의 ‘모든 산을 올라(Climb Every Mountain)’는 원래 배우들의 음성이 아닌 ‘얼굴 없는 가수’들의 노래다. 목소리만 등장한다고 해서 이런 배우들을 ‘유령 가수(Ghost Singer)’라 부르기도 했다.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웃지 못할 뒷이야기들도 있다. 특히, 잘츠부르크 사람들은 영화를 보면 실소를 금하지 못한다는 말도 유명하다. 거짓말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뮤지컬 영화의 첫 장면에 나오는 알프스 언덕이 그렇다. 노래하던 마리아 수녀는 수녀원의 종소리를 듣고 저녁 기도시간에 맞춰 수녀원으로 달려가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 모습을 보면 잘츠부르크 사람들은 웃음을 터트리곤 한다. 만약 영화 속 언덕이 세종문화회관이 있는 시청쯤 된다면, 수녀원은 멀리 사당동쯤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종소리가 들릴 리도 없고, 더군다나 한걸음에 달려갔다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럽다. 잘츠부르크의 현지 사정을 알고 보면 웃음이 터져 나오는 별난 뒷이야기다.
그래도 잘츠부르크에서 <사운드 오브 뮤직>을 찾아보는 재미는 감히 비할 데 없는 낭만적인 체험에 다름 아니다. 큰 딸인 리즈가 아빠 몰래 데이트를 즐기는 헬부른 궁전의 하얀 정자, 아름다운 호숫가에 위치한 폰 트랩 대령의 숙소로 사용됐던 레오폴드스크론 궁, 마리아 수녀가 아이들과 함께 ‘도레미송’을 부르며 뛰어다녔던 미라벨 정원 등은 영화를 사랑했던 이들에겐 감히 비할 데 없는 소중한 추억의 장소들이다. 한 장소씩 소중히 걷다 보면 뮤지컬 속으로 시간 여행을 다니는 별난 체험도 할 수 있다. 여행이 너무도 소중하게 기억 속에 새겨지는 아름다운 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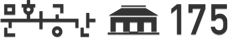

























모차르트 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