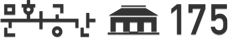가끔씩 이런 생각이 든다. ‘국내 클래식 음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해외 무대에서 한국 클래식 음악가들이 종횡무진 활약 중이고 국내 주요 악단의 수준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래식 음악이 동시대 관객에게 밀접하게 다가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연주자와 관객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리라. 이번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 <Story of Strings> 공연에서 필자는 그런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2012년부터 음악학자 정경영은 매해 여름 열리는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 <썸머클래식>의 해설을 맡아왔다. 언젠가 그는 이런 말을 남긴 적 있다. “음악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음악의 제목과 작곡가를 아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음악을 통해 마음을 울리는 감동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정경영과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의 호흡은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고, 이제 오케스트라와 해설가의 조화는 익숙한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해설자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다
오늘날 음악계에서 해설을 곁들인 음악회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익숙한 현대인에게 긴 호흡의 클래식 음악은 따분할 수밖에 없다. 클래식 음악이 동시대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설자가 등장했지만 현재 해설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꽤나 복합적이다. 공연 전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부터 프로그램에 관한 전문적인 해설까지 다층적인 요구가 존재한다. 정경영은 2016년 세종문화회관 매거진 <문화공간 175>와의 인터뷰에서 “청중은 생각보다 명민하여 낯설더라도 성숙한 경지에 있는 음악은 알아듣는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믿음 때문인지 그의 해설은 관객이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는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응수와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는 완성도 높은 연주를 들려주었다.
지난 7월 11일,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는 <Story of Strings>를 선보였다. 이 공연에서 정경영은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다. 공연명처럼 다채로운 현악기 음색을 즐길 수 있는 기획이었다. 1부에서 선보인 바흐 바이올린 협주곡 2번과 1번, 2부 첫 곡인 바흐의 두 개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은 현악 오케스트라와 쳄발로가 연주했다. 쳄발로 역시 건반이 달린 발현악기다. 무대에 선 정경영은 곡의 시대적 배경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바흐가 살아있던 시기에 음악의 중심지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였다. 바흐가 출생한 독일은 유럽의 변방이었다. 그래서 바흐의 음악에는 이탈리아의 영향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정경영의 말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리허설에서 바이올리니스트 김응수가 바흐의 2악장을 두고 “미소를 띠고 있는 슬픔”이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뻔한 슬픔이 아니라, 정제되고 세련된 슬픔. 이게 바로 비발디와 바흐의 다른 지점이라는 것이다.
정경영은 음악을 설명할 때 구체적이기보다는 추상적으로 접근한다. 이는 관객이 음악을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현대에 이르러 해설이 있는 음악회가 불가결 조건이 되었다면, 해설자들은 관객이 직접 음악을 해석하고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그러한 면에서 정경영과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가 만드는 공연은 해설이 있는 음악회의 모범이 될 만하다.
젊은 음악도들에게 거는 기대감
한양대 교수로 재직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응수의 든든한 리드로 세 개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유연하게 지나갔다. 김응수의 활 컨트롤은 새삼 놀라웠다. 바흐의 음표들을 세세히 분석한 흔적이 묻어나왔고 활에서 표출되는 음악의 완급 조절이 노련했다. 리더의 역할이 체임버 오케스트라의 완성도에 얼마나 크게 기여하는지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였다.
완성도가 높았던 바흐 협주곡에 비해 마지막 곡인 멘델스존 현악 8중주는 약간 아쉬웠다. 멘델스존이 10대에 작곡한 이 곡은 여덟 개 현악기의 재기발랄한 구성이 매력이다. 두 개의 현악 4중주가 대화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협주곡 같기도 어떨 때는 교향곡 같기도 하다. 연주자들의 소통과 호흡이 중요한 작품인데, 여덟 명의 연주자들의 소리가 붕 뜨는 느낌이 도입부부터 마지막까지 지속됐다.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는 오케스트라 아카데미 역할까지 수행하며 우리나라 오케스트라 음악의 미래를 만들고 있다.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는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20대의 젊은 음악도가 모여 있다.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를 거친 많은 연주자들이 현재 주요 악단에서 활약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들으면 이들이 만드는 음악의 ‘완성도’보다는 ‘가능성’에 주목하게 된다. 이번 연주를 지켜보면서도 그랬다. 그리고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의 존재 이유에 대해 깊이 수긍하도록 만들었다. 국내는 오케스트라 아카데미가 없는 실정인데,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베를린 필하모닉의 경우는 일명 ‘카라얀 아카데미’라고 불리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있다. 카라얀 아카데미는 오케스트라와 체임버, 솔로 연주 등 소속 학생들에게 다방면의 기회를 준다. 특히 베를린 필하모닉 단원들에게 직접 레슨을 받고 함께 연주도 할 수 있다. 이번 공연에서도 교육자와 연주자로서 활약 중인 김응수와 함께 음악을 만드는 젊은 연주자들의 고군분투가 보기 좋았다. 그리하여 유스오케스트라의 건강한 가능성을 엿보았다. 이것만으로 충분하고 충만한 의미를 지닌 공연이었다. 노련한 연주자들과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의 다양한 협연이 앞으로도 이어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