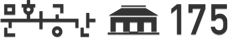‘인생은 생방송’이란 가요가 있다. 송대관이 불렀다. 제목과 가사가 마음에 와 닿는다. ‘인생은 생방송 홀로 드라마/ 되돌릴 수 없는 이야기/ 태어난 그날부터 즉석 연기로/세상을 줄타기하네/ …비바람 부딪히며 살아온 세월/ 하루가 백 년이네/ 인생은 재방송 안 돼 녹화도 안 돼/ 오늘도 나 홀로 주인공’
생방송의 묘미는 ‘이 부분 다시 한번 갑시다’, 다시 말해 편집이 안 된다는 데 있다. 틀려도 꼬여도 어색해도 민망해도 그냥 가야 한다. 완벽하지 못한 아쉬움은 흠결로 남지만 오히려 인간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게 생방송이다. 우리의 하루하루 삶은 가위질하지 않은 날것의 생방송이다.
오늘도 음반장에 CD와 LP들이 자기를 틀어달라고 머리를 쓸어 넘기고 있다. 밤낮으로 계속 들어도 못 들을 분량이다. 그들을 뒤로 한 채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선다. 오늘도 행선지는 공연장이다. 음악 칼럼니스트인 내게 일터이기도 하고 안식처이기도 한 묘한 공간이다.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로비를 거닐다가 객석에 앉는다.
무대 위에 사람(들)이 등장하고 박수가 쏟아진다. 때로는 연주자가 아닌 나 자신에게 보내는 격려로 느껴질 때가 있다. 오늘도 살아서 이 자리에 와 있구나, 대견하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산만해진 정신을 무대 위에 고정하고 집중한다. 공연은 몰입의 즐거움을 알려주는 소중한 제의다.
공연 시작 전의 그 미묘한 긴장감을 사랑한다. 피아니스트가 라 음을 치고 현악 주자의 표정을 살핀다. 몇 번 활을 그어보고 능숙하게 현을 조정한다. 날마다 달래고 함께 해왔을 악기에 묻은 연주가의 고단한 흔적이 느껴진다.

이제 중단 없이 펼쳐지는 인생의 한 드라마에 눈과 귀를 고정하는 일만 남았다. 어떤 부분은 예상했던 감동을 상회하고 어딘가에서는 실망스러운 장면도 스친다. 그러나 공연은 언제나 끝이 난다. 방송 프로그램이 안녕을 고할 시간이 오듯, 나의 삶이 언젠가 끝나듯 말이다.
아침이 다시 찾아오듯 공연은 늘 새로운 회차의 프로그램으로 부활한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공연도 마찬가지다. 보고 들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근사한 음반을 남겼지만 실제 연주는 초라한 사람이 있다. 반대로 음반은 유명하지 않지만 무대 위에서 관객을 사로잡는 예술가도 존재한다. 둘 다 만족시킨 사람도 물론 있다. 생방송 중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베테랑 방송인처럼 숱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꿔버리는 연주가들은 감탄을 자아낸다. 남사당놀이의 ‘어름’같은 줄타기를 바라보던 관객의 아슬아슬한 마음은 점차 신뢰와 감동으로 바뀐다. 이런 음악가라면 다시 무대 위에 오르는 때를 놓치지 않겠다고 객석에서 다짐한다.
사람들 대부분에게 공연은 일상과 상반되는 특별함이다. 공연장에서 보낸 특별한 하루가 일상을 견디는 힘이 되어준다. 내게 공연은 일상에 수렴한다. 객석에서 바라본 매일의 무대는 평범한 나날들을 각양각색으로 채색해준다. 특별한 무대 중에서도 더 특별한 무대가 존재한다.
세종문화회관에서 본 공연들 중 기억되는 무대들이 적지 않다.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베를린 필, 빈 필, 런던 심포니, 런던 필, 뮌헨 필, 몬트리올 심포니 등 오케스트라와 조수미, 이네사 갈란테, 살바토레 리치트라 등의 성악가와 포플레이, 카시오페아, 클라츠 브라더스 등 재즈와 크로스오버까지 다양하다.

아직도 선명하게 떠오르는 공연이 있다. 이탈리아 출신 소프라노 마리엘라 데비아의 첫 내한 독창회다. 2004년 10월 11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본 그녀는 폭포수 아래서 득음에 이른 명창의 실루엣을 보여줬다. 마리엘라 데비아는 로시니 ‘탄크레디’, 벨리니 ‘카풀레티와 몬테키’, 도니제티 ‘안나 볼레나’ ‘샤모니의 린다’ 등 오페라 중의 아리아, 그리고 예술 가곡들을 불렀다. 기존의 국내 무대에서 볼 수 있었던 작품들과는 사뭇 거리가 있는 레퍼토리였다. 한국에서 보기 드문 낮은 대중성과, 높은 난이도의 공연이었다. 완벽에 가까운 가창이 롤러코스터를 타듯 아찔했다. 데비아는 1부가 끝났을 때 대기실에서 “청중들이 왜 이리 조용하냐, 내 노래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냐”고 궁금해했다고 한다.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 2부와 앙코르를 거치며 청중은 하나 둘 일어서서 갈채를 보냈다. 앙코르였던 잔니 스키키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로미오와 줄리엣 중 ‘아! 나는 꿈속에 살고 싶어요’가 끝나자 전원 기립의 장관이 펼쳐졌다.
선명하고 흠결을 찾아볼 수 없이 요철이 딱딱 들어맞던 천의무봉의 노래였다. ‘소프라노 아솔루타'(절대적 위상의 소프라노)로 칭송받던 데비아답게 신들린 듯 자신의 소리를 자유자재로 조이고 풀었다. 완벽주의와 프로정신이 예술이 되는, 생방송 같은 공연을 나는 사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