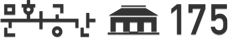극장과 공동체
글. 심보선(시인, 사회학자)
“하늘과 땅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 내렸으니 신은 매일 극장을 창조할 뿐이다”
– 장수진의 시, 〈펑키 할멈의 후손〉 中

장수진 시인의 시구는 예술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게 한다. 아주 오래전 극장과 연극은 위기에 빠진 세상을 구하려 했다. 땅과 하늘과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된 이상 세계를 상상적으로 구현하려 했다.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고대 도시의 극장이 그토록 거대했던 것은 연극의 관객이 인구 전체였기 때문이다. 조선 시대의 판소리도 비슷했다. 판소리는 민중을 위해선 양반을 풍자했고, 양반을 위해선 민중의 생활과 사고를 전달해주는 채널이었다. 연극은 공동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엔터테인먼트이자 커뮤 니케이션이었다.
장 자크 루소는 이상적 공화국을 극장에 비유했다. 배우와 청중, 귀족과 민중의 구별이 사라지는 곳, 무너진 하늘과 땅을 다시 세우는 곳, 상호 호혜와 관용의 공동체 모델이 제시되는 곳, 그곳이 극장이었다. 루소는 현대의 극장을 고대 극장과 비교하며 안타까워했다. 현대의 극장은 루소가 보기에 극장 본연의 모습과 정반대였다. 무대와 무대 밖의 구별, 스타와 평민의 구별,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구별이 사라지기는커녕 강화되는 곳이 현대의 극장이었다.
그러나 극장과 연극의 공동체적 전통은 때때로 되살아나 강력한 정치적 에너지를 발산했다. 내가 아는 가장 인상적인 사례는 폴란드에서 일어났다. 1968년 폴란드의 고전 희곡 〈선조의 전야제〉가 국립극장에서 상연되었다. 당국은 이 연극이 반소비에트 정서를 담고 있다는 이유로 공연을 강제로 중지시켰다. 학생들과 예술인은 봉기했고, 이에 대한 탄압은 더 큰 반체제 운동으로 이어졌다. 모든 것이 연극 한 편에서 시작됐다. 예술의 자유와 정치의 자유는 같은 동전의 다른 면이었다. 군부독재 치하에서 한국의 마당극도 마찬가지였다. 대규모 집회에는 연극이 있었다. 광장이 극장이었다. 연극은 출정식과 다름없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떤가? 무너져 내린 하늘과 땅에 세워지는 극장은 어떤 극장인가? 그 극장을 세우는 신은 어떤 신인가? 우리는 루소에게 아직도 극장의 꿈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어쩌면 다른 신이 다른 극장을 만들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회학자 어빙 고프만은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대사를 사회학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셰익스피어의 〈뜻 대로 하세요(As you like it)〉에 “세계는 무대요. 모든 남자와 여자는 배우에 불과하다”라는 구절이다. 그는 ‘드라마터지(Dramaturgy)’라는 사회학 방법론을 개발했다. 고프만은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아(The Self)를 연출하며 그들이 속한 모든 사회적 공간은 하나의 무대가 된다고 주장했다. 고프만에 따르면 애초부터 ‘진정한 자아’란 존재하지 않는다. 일터와 일상, 조직과 집단 모두가 ‘바람직한 자아’를 드러내는 무대다. 우리는 다양한 소품과 의상과 대본과 연기법을 채용하고 교체하면서 다양한 자아를 연기해간다.
이때의 신은 창조주도 공동체도 아니다. 이때의 신은 자아 자체다. 자아야말로 현대 사회의 상호작용에서 수호해야 할 신성한 대상이다. 개인의 체면, 자존감, 위신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손상되었을 경우 반드시 복구되어야 한다. 고프만의 사회학이 2차 대전 직후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와 소비자본주의가 득세하던 미국에서 탄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미국의 TV 드라마와 영화의 주인공은 공동체의 대표이기 전에 매력적 개인이었다. 아니 매력적 개인이었기에 공동체의 본보기가 되었다. 미국의 무너진 하늘과 땅을 새롭게 비추는 별은 말 그대로 스타였다.
오늘날 매력적 자아 연출을 위한 기법과 무대는 디지털 혁명과 더불어 무한히 확장되었다. 온라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디지털 환경이 제공하는 자원과 기술을 통해 현대의 개인은 자신만의 무대에서 주인공이 된다. 운이 좋으면 하루아침에 전국적, 아니 글로벌 스타가 되기도 한다. 자고 일어나니 연예인이 되고, 지식인이 되고, 예술가가 되어 있다. 이렇듯 자아라는 새로운 신은 자신을 위한 극장을 매일매일 온라인에서 창조하고 있다. 멀어져가는 공동체의 꿈에 탄식을 뱉는 루소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다.
그러나 나는 루소에게 아직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 연극은 왜 계속 만들어지는가? 극장은 왜 계속 세워지는가? 권력은 무엇이 두려워서 연극을 검열하고 탄압하는가? 그 잘났다는 예술가들은 왜 광화문 광장에 천막 극장을 세우고 농성을 하며 사서 고생을 하는가? 최첨단의 화려한 무대들 틈새에서 그 작고 허름한 무대들은 왜 자꾸 나타나는가?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의 일터와 일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개인의 능력과 성공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로 여겨지는 현대 사회에도 대화와 만남은 지속된다. 작은 모임이 큰 모임으로 연결되고 확산되는 사건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일어난다. 우리는 여전히 타인과 함께 학습하고 행동한다. 우리는 지난해 가을부터 올봄까지, 촛불과 탄핵을 거치면서 확인했다. 공동체의 꿈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꿈은 삶과 예술 모두에서 새로운 극장의 형상을 중단 없이 등장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