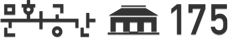세종의 시간을 담은 세종예술투어 Part2
당신이 모르는 세종문화회관 STORY
writer 최지영(세종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세종문화회관은 그 동안 많은 변화를 거쳐 지금의 모습으로 변모했다.
공연예술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는 대극장을 비롯하여 세종M씨어터, 클래식 전문 공연장인 세종 체임버홀이 공연장으로서의 세종문화회관의 모습이라면, 세종 미술관과 지하철역 내 미술관인 광화랑으로 전시예술에 보다 쉽게 접근하기 위한 노력 또한 그치지 않았다.
그 외에도 세종예술아카데미, 세종이야기·충무공이야기, 꿈의 숲 아트센터, 삼청각 등 전통, 교육, 예술을 아우르는 시설로
시민 중심이라는 그 가치를 실현해나갔다.
큰 공연장을 운영하는 세종문화회관은 시설로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공연장의 규모가 큰 만큼 관객들이 공연장 곳곳에서 예술의 미를 발견하길 원했다. 공연장의 계단이나 난간, 벽에는 소소하지만 볼거리 가득한 미술품이나 전시품으로 채워졌다. 20분만, 아니 10분만 일찍 나와서 공연장을 둘러보는 여유를 즐길 수 있다면 미술관을 관람하듯 공연과는 다른 색다른 재미에 빠져볼 수 있을 것이다.
따로 또 같이: 세종체임버홀 변종하 ‘영광과 평화’

세종문화회관 정면의 광활한 계단을 지나 왼쪽에 위치한 체임버홀의 정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바로 보이는 이 작품은 체임버홀의 한 쪽 전체 벽면을 차지하고 있다. 처음 작품을 접하고 있노라면 짙은 갈색과 밝은 갈색, 희미한 파란색이 오묘하게 섞여 내뿜는 흐릿한 색감 때문인지는 몰라도 시각적으로 한 번에 관객들의 눈길을 끌지는 못한다. 어둡고도 흐릿한 색채에 눈이 익숙해질 때 쯤 희미하고도 푸르스름한 빛깔의 구름과 그 사이로 비상하는 일곱 마리의 새가 눈에 띈다. 태양을 향해 날아가기도 하고 땅을 향해 곤두박질치기도 하며 벽화 속을 꽉 채우는 새떼는 각자 혹은 두 마리가 동그란 원에 둘러싸여 마치 침범할 수 없는 자신들만의 공간을 표현하는 듯, 그만의 자유로움과 평화로움을 보여준다.
구상부터 완공까지 만 2년이 걸렸다는 이 로비벽화는 그 규모가 가로 1700cm, 세로 240cm로 ‘돈키호테 이후’, ‘서정적 풍경’ 시리즈 등의 작품을 통해 1960년대 국내에서 서양화가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던 변종하 화백의 작품이다. 프랑스 유학 당시 유동적이고 자유로운 표현으로 대표되었던 ‘추상표현주의’에 싫증을 느꼈던 그는 회화에서 추방된 문학적 요소를 회복한다는 의미의 ‘신형상주의’ 예술을 표방하기 시작했다. 이 작품 또한 그의 예술 기조에서 그 흐름을 같이 한다.
무심한 듯 형상화되고 단순화되어 표현된 새 무리만 보더라도 이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벽화를 단순히 그 자체로 독립적인 작품으로 보지 않았다. 건물과 호흡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 건축물의 벽이자 장식품이 되기도 하고, 또 예술성 높은 그림이기도 해야 한다는 그의 생각처럼 작품에 건축적 요소를 가미하면서도 자체로서 예술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던 그의 노력이 작품 곳곳에서 느껴진다. 벽인지 작품인지 의아할 정도로 색채 또한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것이리라.
벽의 일부로서, 건축물의 장식품의 일부로서 그 역할을 다한 벽화는 그림으로서는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닌다. 동트는 아침 태양을 향해 세차게 날아오르는 새 무리는 조국의 영광과 평화를 기리는 그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은 것이다. 당시까지만 해도 건축물의 벽화 대부분이 건축물의 기념비적이거나 장식용에 그쳤던 것과 달리 ‘영광과 평화’가 지니는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는 작품의 예술성 또한 놓치고 싶지 않았던 작가의 섬세한 고집을 그대로 대변한다. 따로 또 같이, 작품 자체로서 그리고 세종 체임버홀의 일부로서의 벽화, 어느 관점에서 보더라도 자신만의 뚜렷한 색을 내는 작품을 보는 재미가 공연장의 즐거움을 더하고 있다.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좌측계단 박서보 ‘묘법 NO.24-77′

성공한 사람에게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과거의 성공 방법을 답습하기 때문이다. 박서보 화백이 ‘살아있는 현대 미술’이라는 수식어를 꾸준히 지켜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나이 팔순이 넘도록 계속해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기 때문이다.
‘단색화’라는 한국의 추상미술을 만들고 이끌었던 그였던지라 박서보 화백의 작품은 어디에 있더라도 한 번에 눈에 띤다는 게 특징이다. 그의 작품을 관심있는 시선으로 보았던 사람이라면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좌층 계단 벽면에 걸린 박서보 화백의 작품을 단번에 알아보았을 것이다. 1960년대부터 발표한 박서보 화백의 ‘묘법’ 시리즈는 그 기법이 시간에 지남에 따라 변화했다. 1970년대까지 캔버스를 물감으로 뒤덮고, 채 마르기 전에 연필로 선을 긋고 그 위에 다시 물감으로 덧칠하는 반복 작업을 통해 ‘묘법’이 만들어졌다면 그 이후의 ‘묘법’은 한지와 수상안료의 반복 작업을 통해 완성되었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술사에서 그는 자신만의 고유색을 다른 방법으로 내보였다. 대극장에 걸린 작품은 1978년도 작품으로 그의 초기 ‘묘법’이 담겨있다.
“변화하지 않으면 추락한다. 그 대신 변화하면 추락한다.” 라는 그의 말처럼 끊임없는 시도와 변화는 두렵지만 예술에 있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해야만 하는 일이다. 공연, 전시 어느 것이라도 마찬가지이다. 안주와 변화 그 사이의 고통 속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탄생한다.